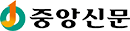| 중앙신문=중앙신문 | 추석을 두어 주 앞두고 벌초할 날이 다가왔다. 새벽부터 서둘러 선산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아직 한낮이면 뜨거운 태양열을 피하려면 일찍 서둘러 일을 마쳐야 한다. 어두운 새벽길을 더듬어 달리다 보니 채 여섯시도 안 된 아침이 뿌옇게 졸린 눈을 부비며 눈을 뜬다. 차츰 산도 보이고 마을도 보이며 세상이 부스스 제 모습을 일으킨다. 해가 돋으려는지 동녘은 조금씩 붉어지고 사방이 자꾸 분명해 진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어둠은 선명해 지는 산과 길과 마을과 가로수에 밀려 아침, 그 빛에 잠겨 사라진다.
이슬이 마르지 않은 산 아래에 친척들의 차가 하나 둘 도착할 때쯤 산으로 올라가가는 길이 온통 풀숲이 되어 사라지고 없는 게 보인다. 먼저 도착한 조카들과 시동생들이 예초기를 메고 산길을 오른다. 뒤이어 도착한 시어른들도 낫 하나씩 들고 예초기 윙 소리가 나는 산기슭을 오르신다. 이젠 그 분들의 몸놀림도 예전 같진 않지만 그래도 가파른 길을 풀을 툭 툭 치며 가신다. 풀 향기가 후욱 스쳐 산길을 덮는다.
지난봄엔 건강하시던 시작은어머니가 산을 못 오르시고 길가에 앉으신다. 나도 작년엔 조카들 붙잡고 산길을 올랐는데 할아버지 산소가 있는 ‘수백리’ 산은 너무 가팔라서 올핸 자신이 없다. 무리하면 벌겋게 부어오르는 무릎을 감당할 길 없어 산길을 오르는 아들과 사위의 뒷모습만 보며 돌아섰다. 차에서 물 한 병 들고 와 작은어머니 곁에 앉으니 물병을 받아들며 힘없이 웃으신다. 초여름 갑자기 뇌종양이 생겼다고 수술을 하시더니 아예 딴 사람이 된 것 같다. 나는 말없이 손을 꼬옥 잡아드렸다. 8월 도랑가에 무성한 풀처럼 씩씩하던 분이 질병의 철퇴로 주저앉은 모습에 가슴이 시리다. 세월에 시드는 어른들의 모습이 아프지만 그래도 이렇게 만나는 것이 고맙기만 하다.
잠이 덜 깨 산에 오르지 않은 어린 아이들이 길가에 앉아서 논다. 자꾸 옆 사람 등에 얼굴을 부비며 잠투정을 부리다가 길가에 이슬 구르는 풀잎도 발로 건드리다가 산을 울리며 들려오는 예초기 소리를 듣다가 내가 내미는 사탕 몇 개에 겨우 일어선다. 일 년에 몇 번 명절이나 벌초 때 또는 집안 행사에 보는 아이들이 조금씩 커가는 모습은 시린 가슴에 잠시 온기를 준다.
햇살이 산등성이 사이로 비집고 올라올 즈음 산으로 올라갔던 사람들이 땀내를 풍기며 내려왔다. ‘어둔리’에 있는 산으로 이동하려면 저 해를 조금 더 붙잡아 두어야 할 것 같은데 야속한 여름 해는 누가 뒤에서 밀어 올리는 것처럼 쑥쑥 밀려 오른다. 햇살은 순식간에 산기슭에 닿고 조명 받은 배우처럼 푸른 기운을 뿜어내는 산에는 아까는 없던 길이 선명하게 나있다. 산 아래 사는 우리가 산위에 누운 할아버지에게로 가려는 길이. 잘려나간 풀들이 어지러이 누운 채로 산길은 긴 선이 되어 햇살에 비친다. 하늘로 날아오르는 연을 띄우듯 하늘과 땅 사이 연줄이 생긴 것 같다.
저수지 앞 어둔리 산은 비교적 완만하다. 삼십여 명의 친척들이 줄은 지어 산을 오른다. 멀리서 보면 개미들이 줄지어 행군하는 것 같다. 예초기에 낫에 돗자리에 과일과 포가 든 봉지를 들고 마치 소풍을 가듯 즐겁게 웃고 떠든다. 해는 어느새 동산에 올라서서 아침 안개를 밀어내버렸다. 나무 그림자 사이로 오랜만에 만난 핏줄들이 앞 서 거니 뒷 서 거니 웃음을 뿌린다. 이번엔 작은어머니도 나도 같이 산길을 오른다. 조카 손을 잡았다가 아들 부축을 받았다가 하면서.
얼마만큼 이어지던 길이 풀에 감겨버렸다. 우리는 다시 칡넝쿨도 걷고 엉겅퀴도 자르며 마치 이세상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오르는 길을 만들 듯 산길을 오른다. 시동생들과 조카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앞장을 선다. 무성한 풀밭은 낫이 앞서고 예초기가 소리를 내며 뒤를 따른다. 풀이 잘려 나가며 산에 길이 나고 나머지 식구들은 풀 향기를 맡으며 그 길을 걸어간다. 저수지가 내려다보이는 산등성이에 부모님 산소가 보인다.
앞서간 장정들이 어느새 상석주변의 풀을 자르고 돗자리를 가져오라 재촉한다. 기독교인들은 잠시 묵상하고 아닌 사람들은 술 한 잔 붓고 절하여 부모님께 예를 올렸다. 봉분이며 주변 풀을 깨끗이 다듬고 갈퀴로 그 잘린 풀을 긁어내려 한곳에 모으고 나니 저승의 부모가 이발하고 새 옷 입은 듯 주변이 반듯하다. 과일을 깎아 한쪽씩 나누고 다시 작은아버지산소로 이동했다. 늦여름햇살은 금세 뜨거워진다.
팔순인 작은아버님들부터 어린 손주들까지 이미 4대에 걸친 가족들이 무리를 지어 햇살을 피해 산길을 간다. 잠시 이승에서 저승으로 길을 낸 듯, 옛사람들 얘기가 오가며 산 사람들이 서로 손을 잡고서. 벌초하는 날은 그렇게 마음속까지 떠들썩해지며 어른들은 나이 들어가고 아이들은 자라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날이다. 내 곁에 서는 동서들 얼굴에도 어느새 주름이 깊어가고 장성한 조카들의 결혼얘기에 미소 지으며 가을이 들어설 것을 예감한다. 산에는 풀 향기가 가득하고 우리들 웃음소리도 메아리 되어 퍼진다. 산이 되어 누운 다른 세상의 그리운 얼굴들도 함께 웃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