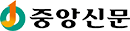| 중앙신문=중앙신문 | 여름철 먹을거리로 수박, 참외, 복숭아 같은 과일을 당할게 없다고 말들 하지만 그것들은 과일이고, 그래도 여름철 으뜸음식은 옥수수이다.
여름철 먹을 게 없어 배를 곯을 때, 맛이나 양이나 영양에서 옥수수를 따라갈 게 없다.
풋풋한 이파리를 주렁주렁 매달고 여름철 땡볕을 이겨내면서 떡하니 버티어 서 있는 옥수숫대는 마치 밭을 지키는 파수꾼 같다. 봄철 가뭄과 잡초들과의 생존경쟁에서 이겨내고 꿋꿋하게 반평생을 살아온 옥수수, 가난한 농부의 반려자이다.
밭둑 외진 곳이나 잡풀 사이에 아무렇게나 심어도 옥수수는 잘 자란다. 기찻길 옆 오막살이 시끄럽고, 흔들리며, 바람이 불어도 잘 자란다고 동요에도 나와 있다. 가난했던 시골에서 도토리, 칡뿌리와 함께 여름철 양식이 되었고, 지금도 일부 지역이나 북한에서는 주식으로 대접 받는 정도이다.
외모는 또 어떤가.
반듯한 외모에, 마치 군인들이 삐딱하게 멘 소총 같이 삐죽한 옥수수, 그 털은 옛날 장군들이 휘날리던 수염 같다. 사관학교 생도 같이 질서 정연한 옥수수는 그 겉모습이 수려한 것처럼 그 맛은 어떤 것에 견줄 수 없을 만큼 고소하고 달콤하다. 혹시 설익은 옥수수 알갱이를 먹어 보았다면, 덜 익은 알갱이가 더 달고 씹히는 맛이 상큼하여 이 세상 어디에도 옥수수를 당할 먹을거리는 없다고 장담 할 것이다.
겹겹이 싸고 있는 껍질을 벗기면 드러나는 옥수수의 싱싱한 속살. 마치 하모니카 같다. 먹을 때도 하모니카를 불듯이 양쪽 손으로 잡고 한 알 한 알 맛을 느끼며 떼어 먹는다. 간혹 점잖은 자리에서 알갱이를 손으로 따서 먹기도 하지만 역시 옥수수를 먹을 때는 한 입 가득 물고 뜯어 먹어야 제 맛이다.
옥수수를 먹을 때의 미각은 달콤하고 오묘해서 첫사랑의 맛과 견줄만하다.
입속이 달콤하고 씹히는 맛이 달콤하고 가슴이 달콤하다. 여름철 먹을거리로 옥수수가 으뜸인 이유를 비로소 알게 된다.
한 소쿠리 옥수수를 쪄 놓고 식구가 둘러 앉아 맘 놓고 먹어도 되니 넉넉하기는 역시 옥수수뿐이다. 옥수수는 여간해 물리지 않는다. 감자나 가을철 고구마는 한 두 개만 먹어도 배가 불러 물리니 옥수수에 비할 바 아니다.
오래전 강원도 지방에 갔을 때 올챙이국수를 먹어 본적이 있다. 한창 시장하여 허겁지겁 맛을 음미할 틈도 없이 한 그릇 해 치웠는데, 올챙이국수 원료가 옥수수라는 걸 안 건 몇 년이 지난 후 국수이름이 올챙이가 맞나 올갱이가 맞나 입씨름을 할 때였다.
옥수수로 빚은 막걸리는 쌀이나 밀가루로 빚은 술보다 구수하고 독하면서 진하여 여운이 오래 남는다. 강원도 지방을 여행할 때 무더운 여름철 산속 개울에 담가 두었던 옥수수막걸리를 마사던 기억은 지금도 입맛을 돋운다.
간혹 잡종이 되면 얼룩옥수수가 되어 점점이 박힌 검은 점은 누가 그려 놓은 것 같이 바둑판 바둑돌을 닮아 색깔의 대조를 이룬다.
우리나라에 들어 온지 3백년 밖에 안 되었다는데, 멀리 남미가 원산지라는데 어떻게 우리 밭둑에 서 있는가.
겨울철이 되면 어머니는 말린 옥수수에 쌀을 섞어 강냉이를 튀겨 오셨다. 구수한 냄새, 고소한 맛, 엿에라도 묻혀 주시면 우리 형제들은 밥 먹을 생각도 없이 강냉이만 먹어 댔다.
옥수수는 먹을거리가 또 있다. 옥수수를 모두 따고 홀로 서있는 옥수숫대는 아이들의 더 없는 간식거리다. 중간쯤 옥수숫대를 잘라 껍질을 벗기고 씹어 먹으면 달콤한 즙이 나와 한 없이 먹었다. 어느 때는 수숫대를 잘못 알고 동강이를 내어 먹다가 어른들에게 들켜 혼나는 일도 있었다. 어릴 적 누구 옥수수가 더 큰가, 누가 빨리 먹나 동무들과 내기를 하며 저녁 한 때를 즐기던 일은 옛날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다.
껍질을 하나하나 벗기고 드디어 옥수수 알맹이가 수줍은 얼굴을 드러낼 때, 여인의 환한 웃음을 보는 것 같다. 꾹 참았던 시련과 한을 한꺼번에 분출하고 드디어 새 세상을 만끽하는 여인의 환희, 옥수수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건 겹겹이 차려입은 여인의 옷이 연상되어서인가. 수줍음 타는 소녀가아니라 한껏 무르익은 여인의 뒤태 같다.
올해는 콩, 고추, 파, 팥을 심은 밭 가장자리에 옥수수 백여 포기를 심었다. 막내 동생이 저희가 심다 남은 씨앗을 주어 참외, 수박과 함께 포트에 심고 물을 주어 햇볕을 쬐어주고 관리를 잘해주었더니 모종이 실하게 잘 자랐다.
밭둑에 심고 물주고 비료주고 정성을 들여서인가 키가 훌쩍 커 2m는 넘게 자라 내가 올려다보게 생겼다. 남의 집 옥수수는 개꼬리가 나오고 옥수수자루가 삐죽이 고개를 내미는데 우리 옥수수는 키는 멀쑥하면서 제일 중요한 일을 빼먹는다.
느긋하게 기다렸더니 과연 키 큰 값을 하느라고 어른 팔뚝만큼 굵은 옥수수를 두 자루씩 매 달았다. 어서 익어야 손자 내려올 때 먹일 거라고 아침저녁 공을 들인다. 아내는 옥수수 옆에 심은 참외와 수박넝쿨을 비집고 자리를 잡으며 손자가 옥수수, 참외, 수박 딸 때의 위치, 거리를 가늠하며 미리 사진 찍을 준비를 한다. 아내는 수박과 참외가 끝물이어서 아이들이 내려올 즈음이면 곯아서 못 먹을 터라고 걱정이다. 아내의 성화를 못 이겨 7월 25일 여름방학을 하고 아파트에 들어서는 손자 녀석을 낚아채듯이 데리고 내려왔다. 손녀 손자가 넷이나 되어 마음껏 먹여 주려고 올해는 옥수수며 참외, 수박을 더 넉넉하게 심었다. 손자 지호 손으로 옥수수며 수박, 참외를 따는걸 보고 싶고, 옆에서 농작물의 파종부터 결실, 수확까지 과정을 가르치고, 자연과 작물과 농부의 마음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함을 일깨워 주고 농사뿐 아니라 다른 일도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아내는 손자의 포즈를 잡아주며 연신 셔터를 눌러댄다.
초등학교 1학년 짜리가 무얼 알겠는가마는 이다음 저 커서 기억을 하면 할아비의 정성도 알아 달라고 축원하는 마음이다.
올 여름도 밭둑에서 가뭄을 이기며 탐스럽게 자란 옥수수를 맛있게 먹었다.
여름에는 옥수수가 있어서 좋다. 옥수수가 있어야 비로소 여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