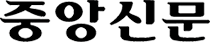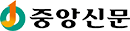| 중앙신문=김성운 기자 | 요즘 좀처럼 보기 힘든 분홍빛을 한 ‘목화’와 우연히 조우했다. 그냥 지나칠 수 있었지만, 꽃이 예뻐 눈길이 갔다. ‘목화꽃’은 13일 오후 용인에 위치한 한국민속의 푸른 목화 잎들 속에서 연한 분홍빛을 내며 흔들흔들 가을바람을 맞고 자태 곱게 피어 있었다. 내 눈엔 그랬다.
‘목화’를 보러 한국민속촌에 간 것은 아니지만, 옛것을 보려면 한국민속촌에 가보라는 친구의 말이 딱 들어맞는 순간이었다.
사실 ‘목화’ 하면 과거 국민학교에서 배웠듯, 우리나라에 최초로 목화씨를 갖고 들어온 고려 말기의 학자이자 문신이었던 ‘문익점’이 자연스레 생각나기 마련이다. 과거 국민학교 시절의 기억 속이 그렇듯 우리나라 국민의 4~50대 이상 대부분이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란 느낌이 든다. 맞다. 우리나라에선 문익점 하면 목화씨가 떠오르고, 목화씨 하면 문익점이 아직도 떠오른다. 이런 ‘목화꽃’을 만나 이리저리 한참을 들여다봤다.
우리가 입는 순면으로 된 속옷과 티셔츠, 남방 등 다양한 의류 등이 면을 이용해 만들어지고 있다. 바로 이 면을 생산해 내는 게 ‘목화’다. 사진에서 볼 수 있듯 ‘목화’에서 꽃이 피면, 그 자리에 몽우리가 생기고 몽우리가 익어 부풀어 오르면서 터지면 그 안에 솜이 보인다. 이런 솜을 수확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면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많이 재배됐지만 지금은 극히 일부에서만 재배된다. 재배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는, 고된 노동과 일손 부족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싼 섬유들이 많이 개발된 탓도 있겠다.
이번에 처음 알았지만, ‘목화꽃’은 오전에는 아이보리색으로 피었다, 오후가 되면 핑크빛으로 변하고 이내 시들어지는 신비한 속성을 가진 하루 살이 꽃처럼 보인다. 아마도 빨리 솜을 만드려고 꽃이 하루 만에 시들어지는 걸까.
과거, 고려 말기의 학자이자 문신이었던 ‘문익점’은 당시 원나라 사절단으로 차출되면서 우리나라로 돌아올 때 목화씨 10개를 붓통에 숨겨 들여왔다고 전해진다. 그렇게 들여온 목화씨는 우리나라에 급속히 퍼져 나갔고, 명주·모시·삼베로만 옷을 만들어 입는 등 항상 추위에 떨고 지내던 서민들이 목화 재배의 성공으로 추위를 견디게 됐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조선시대에는 삼베 대신 흰 목화송이가 통화의 단위가 되었다고 한다.
백성의 추위를 잊게 한 ‘문익점의 애민정신’이 새삼 새롭게 느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