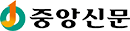| 중앙신문=중앙신문 | ‘엄마’ 란 이름. 그냥 막연하게 불러만 보아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애틋해지는 명사다. 이 세상에서 ‘엄마’ 란 이름보다 더 그립고 애틋한 부름말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요즈음 항간에서 ‘엄마’란 그 고귀한 이름을 내동이치는 사고뭉치들을 보고 있노라면 가슴이 저려온다. 그 애틋함 받아야 할 엄마가 스스로 자신을 함부로덤부로 시궁창으로 내몰고 그 거룩한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다. 거론해 보려고 해도 차마 그 사연들을 입에 올릴 수가 없다. 봉사와 희생과 사랑으로 똘똘 뭉쳐져야 할 귀한 단어를 송두리째 짓밟아버리는 사연들이 부끄럽고 또 부끄럽다. 그를 엄마라고 할 수 없는데 그래도 그는 품어주고 낳았으니 따로 지칭할 부름말이 없어 그는 엄마임이 분명하다. 짐승의 세계도 엄마란 행위는 거룩하고 거룩한데 말이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서로에게 삶의 희망이 되고 세상으로부터 도망치지 못할 이유가 되며 그 연결고리는 삶의 이유를 더할 수 없이 팽팽하게 만들어 준다. 내가 품었고 낳고 키웠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들 관계의 존재는 늘 각별하다.
엄마가 아기를 품에 품고 있을 때의 안락감,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의 신기함, 그리고 갓 태어난 생명에게는 타고난 아름다움이 존재함으로 애타도록 절절한 사랑이 저절로 우러나온다. 울어도 귀엽고 아가가 선보인 응가도 예쁘다고 엄마들은 말 한다. 먹고 싶은 것 먹을 수도 잠자고 싶을 때 잘 수도 심지어는 화장실을 제때에 가기가 어렵고 매일 똑 같은 삶에 감금을 당하고 살아도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내게 없다고 생각하면서 엄마는 비로소 엄마가 된다.
어찌 보면 엄마란 역할을 제대로 하다가보면 자기 개인의 꿈이 무기력해지고 유예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부모가 되면서 사회의 일원이 되고 아기 덕분에 우린 더 귀한 존재가 되며 한사람으로써의 성숙된 성인이 된다. 긴 인생으로 바라 볼 때 엄마가 되는 일이 그 아름다운 희생이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한 사회인의 구성원으로써 구실을 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된다.
필자는 요즈음 엄마라는 이름에 치욕을 덧씌우고 자기 개인의 자유로운 삶을 위해 ‘엄마’라는 이름을 스스로 포기하는 젊은이들에게 보내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 그들에겐 오늘의 자기 인생도 소중하지만 미래 없는 오늘은 사장된 오늘이라고 경고한다. 세월이 흐르고 나이 들어가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가장 행복했고 잘 했다고 생각하는 일이 무엇이겠는가.
필자는 사십대의 아들 형제가 가장 소중한 유산이라고 말하는 아들 형제의 육아일기를 정리하면서 자위한다. 거기엔 나의 이십대의 푸른 시절도 담겨 있으니 말이다.
거북이 형의 토끼 아우의 육아일기 일부
1972.7.8 (생후 27일) 체중:4.9kg. 흉위:38cm, 두위:38.5cm, 신장:59cm
밤알만한 주먹을 바스러지도록 꼭 쥐고 엄마의 가슴 속을 파고드는 아기, 고 작은 입에 젖꼭지를 물려 놓고 맑은 눈동자를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나도 모르게 가슴이 더워 온다. 아기는 배릿한 젖비린내를 솔솔 풍기며 엄마와 눈을 맞추려고 눈망울을 연신 굴린다.
빛나는 아기의 눈동자에는 엄마가 담겨 있다. 아기는 가끔 눈을 깊이 감았다가 다시 뜨면서 검은 눈동자에 엄마를 담아냈다. 낯이 선 엄마를 익히려는 것일까. 아직 알아보지 못하는 엄마의 모습을 눈에 익히고 가슴에 담아 두려는 듯 오늘도 아기는 오랫동안 엄마를 쳐다보곤 했다.
1972.8.17(생후 66일)
아침부터 병원을 드나드느라 피곤했던지 아기는 낮잠을 길게 잤다. 나는 평화롭게 자는 아기 곁에서 하얗게 눈이 부신 기저귀를 개기 시작했다. 먼저 천 양쪽 귀를 탁탁 잡아 당겨서 올이 반듯하도록 만들고 반으로 접어서 바닥에 펴놓고 손바닥으로 살살 쓰다듬어 잔주름이 펴지고 느낌이 보드랍게 만들었다. 그리고 아기 엉덩이에 알맞도록 요리조리 접었다.
반듯반듯하게 접혀서 쌓여진 기저귀를 다독거리고 있노라니 괜스레 가슴이 먹먹해지고 목울대가 아파 왔다. 형체를 알 수 없는 고마움과 그리움 때문에 눈앞이 흐려져 왔다. 창으로 보이는 말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한 줄기 시원한 바람이 불어 와 아기의 보드라운 머리카락을 날리며 내 뜨거운 가슴을 식혀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