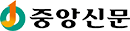| 중앙신문=중앙신문 |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세상이다. 변화를 꿈꾸고 개혁을 단행하는 세월 속을 걸으며 문득 떠오르는 생각은 변하지 않으려 해도 저절로 변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다. 산도 변하고 강도 변하고 하늘도 변한다. 그 가운데 사람인 우리도 변해 가는데 무얼 그렇게 변화하려고 몸부림치는지 의아하기도 하다.
여고 동창들 모임에 가면 하나같이 거짓말을 한다. ‘어머 너 그대로다, 어쩜 이렇게 안변했니?’ 몇 십 년 만에 만난 친구가 아직도 열여섯 꽃 같은 얼굴일 리 없는데 우린 서로에게 이런 거짓말 같은 인사를 건넨다. 그런데 그 말이 아주 거짓도 아니다. 실제로 이제 육십이 넘은 친구의 얼굴 어디엔가 단발머리 소녀의 모습이 그대로 보이니 말이다. 이젠 세파를 겪어 주름진 얼굴에 더러는 구부정한 체형인데 어디가 여고생 얼굴이냐고 물으면 할 말은 없다. 그러나 분명 그 동그랗던 눈매며 입 꼬리를 올리며 살짝 웃던 특유의 미소나 몸짓이 우리 눈에는 금세 단발머리의 ‘그녀’로 비쳐지기만 한다. 변하는 것 속에서 변하지 않는 무엇이 존재한다는 건 묘한 정감을 불러일으킨다.
얼마 전 이제는 헌법재판소 자리가 된 옛 교정을 기웃거리다 나도 모르게 그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이곳에 있던 여고 출신이라니 경비아저씨가 기꺼이 들어오라신다. 교실이 있던 자리엔 다른 건물들이 들어선지 오래지만 작은 언덕위의 나무가 그대로다. 백송! 하얀 소나무가 그때 그대로 거기 있다. 저 나무 앞에서 교복차림의 내가 수도 없이 사진을 찍었었지. 신기한 소나무가 우리 학교에 있다고 시골 엄마에게 편지 쓸 때면 흑백사진으로 다 설명할 수 없어 하얗게 벗겨져 떨어진 나무껍질을 편지사이에 넣어 보내곤 했었지.
나는 다시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었다. 마치 그때로 돌아간 듯 수줍게 웃으면서. 주변의 옛 모습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는데 나무 하나가 시간의 이정표처럼 나를 지나간 시절로 안내하고 있다. 나 또한 이제 옛 모습을 잃어가서 다른 사람이 되어 이곳에 왔건만 이상하게도 내 귀엔 친구들의 재잘거림과 수업 종소리가 들려온다. 나무복도를 종종거리며 걷던 소리와 선생님의 분필소리 심지어는 친구들의 사각거리는 연필소리도 들린다. 좀 있으면 도시락 몰래 여는 소리가 들릴 판이다. 나도 모르게 빙긋이 웃는다. 바람 한 자락 내 앞을 지나갔다. 그 바람결에 내 짧은 시간여행이 후욱 날아간다.
옛날 등굣길이던 종로로 가는 길을 걸으며 옛 모습이 남아있는 장소를 찾느라 나는 분주했다. 운현궁 앞도 달라지고 낙원떡집골목도 다른 곳이 되었다. 배고파 드나들던 분식집도 떡볶이 집도 꽈배기 집도 이젠 다 사라졌다. 어디쯤 그곳이 있었던가 생각하며 나는 두리번거리기에 바빴다. 차 한 대가 ‘빠앙’하고 지나간다. 지금 내가 찾아야 할 곳은 그곳이 아니고 전철을 타야할 곳이라고 말해주고 가는 듯하다.
돌아오는 차창 밖의 풍경도 예전엔 상상하지도 못하던 모습들이다. 이 전철이며 저 도시들이며 핸드폰을 손에 든 사람들의 모습. 어느 하나도 그대로인 게 없다. 시간이 가면 모든 것이 변하고 그것이 자연의 섭리려니 하면서도 변해가는 모든 것들이 아릿하게 아파온다. 사는 것 자체가 변화이고 흘러가는 것임을 어쩌겠는가.
백송처럼 세월이 흐른 후에도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것들이 그나마 위로가 된다. 마치 아무 약속 없이도 돌아올 님을 기다리듯 그 자리에 서있는 나무에게 고맙다는 생각이 든다. 오래 잊고 살아 와보지도 못하는 나를 반기듯 서있는 나무에게서 느낀 따스함이 아직도 내 손을 잡고 있는 것만 같다.
변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옛 모습을 그대로 지닌 곳에 이르면 마치 어느 동굴의 오래된 벽화 속에서 시간을 넘어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기분이 든다. 흘러가는 세월의 물살에서 변하면 안 되는 가치를 지닌 것들을 떠올려 보았다. 사랑이나 믿음 또는 고향 같은 단어를. 그런 소중한 것들조차 ‘변화’의 물결 속에서 잃어버리는 것 같아 씁쓸해진다.
무수히 흔들리는 내 마음 속 어느 숲길에도 백송처럼 변하지 않고 서있는 무엇이 남아 있을까? 먼 훗날 행여 알아보지 못할까봐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때처럼 그렇게 서있는 나무 한그루 찾아보고 싶다. 그때 그대로, 바람에 가지 흔드는 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