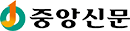| 중앙신문=김영택 | 해바라기는 꽃의 모습이 해를 닮았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햇빛을 보고사는 많은 꽃들 중에서도 유독 해바라기만은 태양의 주위를 도는 궤도의 횡성처럼 해를 많이 바라다보고 산다.
봄에 싹을 튀어 한 여름에 꽃을 피우고 가을에 작은 씨앗을 톡톡 여무는 해바라기는 둥근 얼굴 전체에 작은 열매를 빼곡히 영글어서 결실의 가을임을 몸으로 말해준다.
온종일 한 곳에서 읍하며 서있는 해바라기 모습을 보면 다소곳히 서있는 여인상으로 비치기도 하고 세월의 흐름 속에도 자세를 흩트리지 않고 당당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옛 장승의 위용을 보는 것만 같다.
대부분 농작물이 그렇듯이 해바라기는 가을에 수확한다. 예전에는 관상용과 약용으로 나뉘어 자투리땅과 공터에 몇 주의 해바라기를 심는데 그쳤지만 해바라기 씨앗과 기름이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효능이 높자 지금은 단지로 재배하는 곳도 생겨났고. 일반가정에서는 밭이나 집 앞 공터에 꽃을 가꾸듯 심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씨앗은 유용하게 사용을 한다.
가을은 겨울을 이겨내기 위한 동면 활동의 준비기간이다. 산에 핀 오색단풍이 지고 논과 밭이 까칠해지자 기다렸다는 듯이 겨울이 찾아왔다. 찬바람을 앞세우고 서리꽃을 하얗게 핀 겨울 날씨는 몸을 절로 숙이게 하고 목을 움츠리게 한다 사람들의 활동을 방해하고 굼뜨게 한 겨울 추위는 한낮이 되어서야 누구러졌다 햇빛이 찾아들고 온도가 상승하자 나는 몸을 덮여야 활동에 들어가는 가마우지와 악어의 처지가 되었다.
한참을 창문가에 들어앉아서 따뜻한 햇빛을 쬐자 너무 게을러지고 집안에만 틀어 박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불쑥 들어 가을걷이를 끝냈지만 주인을 잘못 만나 남들 보기에도 민망스러운 밭에나 나가서 밭 정리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집에서 밭까지 가는 거리는 차로 십 분 거리다 차를 몰아 밭가에 도착하자 주변의 땅들과 내소유의 땅이 한눈에 비교가 된다. 태풍이 지나간 듯 헝클어진 내 밭은 단정하게 정리된 이웃의 밭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아차, 농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죄책감에 단물만 빼먹고 앙상하게 방치한 고춧대와 페비닐등 영농 잔재물을 걷어내기 시작했다 얼마쯤 밭에서 일을 하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얼굴에서는 땀이 송골송골 배어난다 흘린 땀을 닦기 위해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잘 정리된 이웃집 밭을 부러움 속에 바라다보니 깨끗이 정리된 밭 때문에 종전 눈에 안 띄었던 말라붙고 볼품없는 해바라기 두 주가 눈 안에 들어왔다.
우리 밭과 경계를 이룬 이웃집 밭은 팔순이 가까운 할머니가 겨울을 제외하고는 하루도 빠짐없이 농사를 지으시기 위해 왕래하는 활동장소 이면서 삶의 터전이었다.
밭에 담이 없다 보니 농사라고는 처음인 우리 내외의 농사짓는 모습을 눈여겨보신 할머니는 기가 막힌 듯 어이없어하시면서도 귀농인으로 생각이 드셨는지 밭곡식 심는 법을 때때로 일러주셨고 몸에 배지 못해 쩔쩔매며 농사짓는 모습이 때로는 안쓰러워 보였던지 당신이 기른 채소를 이따금 맛보기로 안겨주셨다.
깔끔한 성격인 할머니의 밭은 우중충한 내 밭과는 달리 항상 윤이 났고 기름져 보였다 그만큼 밭 가꾸기에 열심이셨고 자식들 보듯 뒷바라지를 하는 통에 밭에 심은 작물들도 그 정성에 보답하려는 듯 풍성하게 쑥쑥 자라났다.
농사를 해본 경험이라고는 전혀 없다시피 한 주제에 그래도 농사를 짓는답시고 할머니와 자주 접촉을 하다 보니 할머니의 농사짓는 방식은 설명을 안 해줘도 곁눈질을 통해 알 것만 같았다.
눈여겨보니 할머니의 밭 관리 스타일은 밭에 풀 한 포기 나는 것조차 허용하지 못하는 성격이셨고. 밤새를 못 참아 새벽부터 달려 나와서 심은 작물의 발육상태를 일일이 확인하며 애지중지 하시는 분이었다.
그런 성격의 할머니가 밭가에 심어놓은 해바라기를 수확하지 않고 방치해 논 것이 어딘가 이상스럽게 보였고 이해가 안 갔다. 머릿속에 물음표를 증식시켜 가는 도중에 어디선가 멧비둘기가 날아왔다. 멧비둘기는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해바라기 머리 위에 앉더니. 연실 입질을 해대며 해바라기 씨앗을 빼내어 주린 배를 채워갔다. 조금 있자 까치가 깍깍거리며 날아왔다 배를 채운 비둘기는 배고픈 까치를 위해 기꺼이 자리를 비켜주었다. 힘 안 들이고 식단을 차지한 까치는 비둘기처럼 부리를 놀리며 해바라기 씨앗을 꺼내먹기에 바빴다. 또 얼마쯤 시간이 지났다 배가 불렀던지 까치도 하던 행동을 중단하고 다른 곳을 향해 날아가버렸다.
까치가 떠나자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듯이 청설모가 찾아들었다. 인근의 야산에서 먹이를 찾아 내려온듯한 청설모는 해바라기가 서있는 곳이 자못 자기 영역인양 요란스럽게 영역 표시를 한 후 해바라기 씨앗을 까먹는데 분주했다.
그제야 나는 할머니가 왜 해바라기씨를 수확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는지 그 깊은 뜻을 조금은 알 것만 같았다. 할머니가 밭가에 해바라기를 그냥 남기신 것은 까치밥 때문이었다. 까치밥은 농부들이 한해의 농작물을 수확함에 있어 추운 겨울 폭설과 한파에 먹이를 찾지 못하는 힘없고 약한 동물들을 위해 식량으로 남긴 작은 배려다.
그 덕택에 하늘을 나는 작은 새들이 아사하지 않고 겨울을 든든히 버텨 나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있는 것이다 청 살모까지 가세하여 씨앗을 마구 털어가자. 해바라기의 얼굴 모습은 천연두를 앓은 듯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된 몰골이었다. 그래도 해바라기는 슬퍼하거나 짜증을 내지 않고 담담해 보였다. 숲 속의 작은 동물들에게 골고루 먹이를 제공한 해바라기의 모습은 마치 순교자와도 같은 거룩한 모습이었다.
해바라기를 한참 바라다보고 있노라니 금방이라도 저편에서 밭주인인 할머니가 미소를 띠시며 나타날 것만 같았다. 그리고 이를 반기는 해바라기가 꺽다리 키에 어울리지 않는 애교를 바람에 살랑살랑 부릴 것만 같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