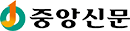| 중앙신문=중앙신문 | 내 집 마당에 조그만 연못이 있다. 본디 논이었던 터에 집을 앉힌 까닭인지 맑은 날에도 마당이 질척거려 궁여지책으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겉보기는 개구리 목욕통이라 불릴 만큼 작고 볼품이 없지만 조금씩 솟아나는 물도 있고, 갯물이 흘러들기도 해서 실상은 물고기와 어리연이 함께 어울리는 생명의 터로, 때때로 푸른 하늘까지 들어와 쉬어간다. 연못 바깥쪽을 따라 한 뼘 폭으로 물길을 내고 물을 흘렸더니 제법 졸졸 소리를 내며 개울인양 흐르는데 원두막 주춧돌 언저리에서 작은 물레방아가 돌아간다. 옴팍한 곳에 모였다가 맵시 있게 떨어져 흐르는 물위로 이른 봄에는 매화 꽃잎이 춤을 추듯 내려앉고 한여름 오후면 가끔 멧새들이 날아와 요란하게 멱을 감는다. 그러다 가을이 깊어 여기저기서 날아온 나뭇잎들이 쌓여 물길이 느려지면 물레방아는 멈칫거리다가 첫눈이 내릴 즈음이면 돌기를 포기하고 깊은 동면에 들어간다.
남편이 뜬금없이 물레방아를 만들겠단다. 젊은 시절 바쁘다는 핑계로 웬만한 못질까지 내게 맡겼던 남편은 양평살이를 시작한 이후로 쉬엄쉬엄 기우뚱한 원두막도 짓고, 판자 틈으로 바람이 들락거리는 새집도 만들어 달고, 살짝 틀어진 닭 모이통 등등 아쉬운 대로 필요를 채우는 목수가 되었다. 손은 매일 상처투성이고 어림짐작으로 만드는 솜씨라 재료는 정한 분량의 곱절이나 들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나아졌지만 삐뚤게 긋는 선 때문에 내게 ‘삐뚤이목수’라 불리는 남편 손에서 낡고 토막 난 조각나무들이 움직이는 물레방아로 만들어질까 속으로 웃었는데 어느 날 작은 물레방아가 되어 돌아가고 있었다. 살짝 기울어진 모습으로 삐걱거리며 신나게 돌아가는데 물소리와 함께 시아버님의 목소리가 환청으로 되살아났다.
“물은 아래로, 낮은 곳으로 흐르지.”
언젠가 성묘하러 들린 선산에서 철원 들판을 바라보며 하셨던 말씀이다. 평야의 강이라 어디가 상류인지 구별이 안 된다 했더니 물이 흘러가는 쪽이 아래라며 9.28수복 후에 남의 손에 넘긴 전답과 흔적으로만 남아있는 물레방앗간 사연을 풀어놓으셨다.
강원도 평강군에서 발원한 한탄강이 철원 고석정 부근을 돌아내릴 즈음 개울 하나를 만난다. 상류에 제법 큰 저수지가 있어서 고만고만하게 흐르는 개울을 거슬러 오르면 넓은 들판을 지나게 되고 한 모롱이 살짝 외로 돌면 동송면 장흥리, 옛 고향마을에 이른다. 현무암으로 된 한탄강은 예나 지금이나 굽이굽이 절경인데 전쟁으로 떠나오고는 성묘 철이나 되어야 찾는 시댁 선산으로만 남아있다.
세 아들을 두셨던 시할아버지는 물레방아를 만드는 솜씨 좋은 목수셨단다. 아들네가 가정을 이루면 미리 봐두었던 몫 좋은 곳에 물레방앗간을 지어주었는데 둘째인 시아버님에게는 면화다리 위쪽에다 널찍하게 자리를 잡아 주셨던 것이다. 방앗간은 마을에서 반 마장쯤 떨어져있었지만 늘 마을사람들로 붐볐단다. 쉴 사이 없이 돌아가는 물레방아 덕분에 마련한 논밭이야기며 함께 나누며 살았던 이웃이야기들이 끝없이 꼬리를 무는데 눈빛이 시공을 거스른다. 왜 아니 그리우실까.
다섯 살 아이였던 남편은 물레방아를 만들던 할아버지 곁에서 거저 뛰어 놀기만 했었단다. 열한 살 즈음에 전쟁으로 고향을 떠나온 이후 할아버지가 목수였다는 사실은 거의 잊고 지냈으며 손으로 물건을 만드는 일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왔는데 어찌어찌 나무를 자르고 만져 물레방아까지 만든 것에 스스로 얼마나 대견해하는지.
장난감을 면한 수준으로 겨우 하나를 만들었을 뿐인 솜씨로 송학리에 있는 교회 연못에 큰 물레방아를 만들어 놓고 싶단다. 그 솜씨로는 어림없다며 전문 목수에게 맡기자는 내 말에 동의하는가 싶었는데 텃밭의 일이 뜸해지던 늦가을에 기어코 목재를 들여왔다. 솜씨타박을 하는 내게 보란 듯이 자르고, 맞추고, 다듬기를 되풀이하며 시골장마당으로, 대장간으로 부속품을 구하느라 부산스럽게 발품을 팔더니만 겨울을 넘기고 이듬해 4월 끝 무렵에 커다란 물레방아를 마무리해서 세운 것이다.
봄비 내리는 산골짝에서 지름이 2미터나 되는 물레방아가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연못에 물을 쏟아 놓는다. 막 꽃잎을 열기 시작한 진달래가 흩어지는 물보라를 마주하더니 곧바로 작은 쌍무지개를 쏘아 올린다. 숱한 시행착오 끝에 만든 것이라 부실한 부분이 왜 없을까마는 보고 있으려니 내 눈은 절로 작아지고 입가엔 실실 웃음이 번진다. 바라보는 이들의 그리움이 골짜기의 물을 부추기는지 물레방아는 쉬지 않고 잘도 돌아간다.
할아버지로부터 물레방아 만드는 재능이라도 받은 겐가. 나 혼자 속으로 하는 말에 옳소, 옳소 응답이라도 하는 것처럼 물레방아가 크게, 또 천천히 돌아가는데 발탄 강아지처럼 촐랑거리며 돌아가는 우리 집 작은 물레방아가 그 위에 함께 포개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