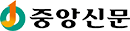| 중앙신문=송년섭 | 비가 내린다.
공경재 마루에서 들리는 빗소리는 정말로 비인지 바람소리인지 밭둑 은행잎 흔들리는 소리인지 구분이 안 된다. 옆 비닐하우스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듣고도 못 믿어워 진다.
결국 읽던 책을 거꾸로 뒤집어엎고 뒷짐을 진채 마당에 내려선다. 고개를 반짝 들어 얼굴과 이마에 빗방울을 맞아 본다.
아. 비다. 비가 맞다. 비가 내리고 있다. 장마가 시작 될 거라더니 이제 농부의 눈가에 웃음기가 보이겠지. 점차 굵어진다. 함석지붕 위, 옥수수 잎, 물통에 각기 다른 소리를 내며 떨어지고 있다. 빗소리는 교향곡을 연주하는 악기의 음과 흡사하다. 자연이 빚어내는 신의 소리이다.
비는 물이요, 물은 생명이다.
학교 다닐 때 시골집에 내려오면, 언제나 아버지는 문밖골(우리 논이 있는 곳의 지명) 둑 넘어 개울가에서 한 모금의 물이라도 더 캐내려고 삽과 곡괭이로 개울바닥을 파셨다. 장마가 시작되기 전 모내기를 못한 농부들은 모두 힘들게 물 전쟁에 나서야 했다. 4000평쯤 되는 문박골 논은 우리의 생명선이었기에 먹고 살려는 우리의 노력은 치열했다. 우리 형제도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물길을 고르고 논에 물을 대었다.
수멍을 따라 물이 흐르면 논으로 퍼지는 물길, 그 시원찮은 물길을 보는 아버지의 안타까움. 어찌어찌 모내기를 하고도 초여름 따가운 햇볕에 논이 마르면 농부의 가슴은 마른 논과함께 타들어 간다. 빗소리는 그래서 생명의 원천이다.
집 앞 개울에 붉은 흙탕물이 둑을 넘을 기세로 콸콸 흐른다. 이런 흙탕물이 두세 번 지나가야 장마가 끝나고, 비로소 농부의 얼굴에서 가뭄걱정이 사라지는 것이다.
논농사 물이야 여주강물이 해결해 주고 밭곡식도 대부분 지하수 모터가 대신해 준다. 지하수를 쓸 수없는 밭은 속수무책이다.
적당한 비를 때맞추어 내려주면 하늘에 깊은 감사를 드리련만, 심심하면 가뭄과 홍수를 보내니 참으로 어렵다.
어느 참고서를 보니 지구 표면의 4분의 3이 바다, 빙원, 호수, 하천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물을 모두 합치면 13억 3,000만 ㎦이며, 지하수의 형태로 820만 ㎦가 저장되어 있다고 한다. 장마가 오락가락하던 며칠 전, 남극 서쪽 끝에 있는 라르센 C빙붕(얼음덩어리 면적 44,200㎢)에서 무게 1조톤, 면적 5800㎢에 달하는 빙산이 쪼개져 분리 됐다고 한다. 빙산의 일각이 이만한데.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물의 양에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과학자들의 이야기이니 까다롭게 따질 수는 없겠지만 물의 양이 그것밖에 안 될까.
이러한 해수, 육지의 물이 태양열을 흡수하여 13,000㎦에 달하는 수증기가 되어 대기 속에 확산되고 그 수증기가 응축되고 모여 구름이나 안개가 되고, 다시 비, 눈, 우박으로 땅에 내린 다음, 다시 모여서 하천이 되어 강으로 바다로 흘러간다. 학교에서 배운 ‘물의 순환’이다. 왜 어느 지역은 비가 안와 사막이 되고 어느 지역은 가끔 홍수가 지는지. 과학자들이 풀어야 할 숙제가 한 가지 더 얹혀 진다.
물은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물질의 하나일 것이다. 물이 없으면 생명체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은 동물, 식물, 심지어 광물에게 까지도 생명의 근원으로서 생명을 유지시켜 준다. 생색을 내지 않는다. 물의 효능이나 효과, 생명에 미치는 영향이야 필설로 다 하랴. 마치 자식 기르는 부모의 마음 같다.
장맛비가 며칠 내리더니 개울에 제법 붉은 물이 흐르다. 바쁘게 전답에 매달리던 농부에게도 빈대떡에 소주잔을 기울이는 여유로운 시간이 주어진다. 물이 주는 은혜다. 물은 심술도 부릴 줄 안다. 몇 해 전 이웃마을 부인네가 불어 난 개울물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다.
강렬한 햇볕과 짙푸른 숲, 나무들, 그 사이를 흐르는 개울물, 소리가 가끔 바뀌지만, 다양한 음성으로 무리지어 내려가는 물의소리는 귀엽다. 그 물에서 발가벗고 어린 시절을 보냈던 기억이 새롭다. 여러 명 되던 어릴 적 동무들은 벌써 저 세상을 갔거나 외지에 가 있어 남은 친구는 몇 안 된다.
얼개미로 물고기를 잡는다고 텀벙대던, 장마 지난 개울은 우리들의 놀이터였는데... 나이 들어 내려다보는 그 개울은 가뭄을 이기려던 아버지의 모습이 남아있고, 가난한 농부의 안타까운 한숨이 되기도 하고 환호성이 되어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가녀린 연인들의 속삭임으로 맑은 모래 위를 흘러가는 물소리가 정겹다. 빗소리는 물소리로, 생명의 소리로 승화하면서 추억과 희망을 가꾸어 간다.
※ 공경재 : 우리 집 사랑채의 당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