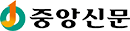| 중앙신문=중앙신문 | 추석이다. 세월은 빠르다더니 과연 빠르다. 추석이어도 세시풍속(歲時風俗)이 바뀌고 다례가 간소화 되면서 주부들도 하는 일이 별로 없고 추석빔 타령하는 아이들도 없으니 명절의 의미도 많이 퇴색되었다.
그러나 반드시 거쳐야 할 행사가 있으니 바로 벌초다. 추석 한 달 전부터 셋째 주, 두 번째 주말이 절정이다. 여기 저기 벌초하는 모습들이 눈에 띄고 예초기소리가 산을 울린다. 한바탕 난리가 지나가면 깔끔하게 다듬어진 산소가 제 모습을 드러낸다. 조상을 모시는 법도가 유별나서인가, 우리나라 모든 백성은 대대로 산소를 가꾸고 유지하는데 정성을 다하고 있다. 풍수학에서 얘기하는 양택(陽宅)과 음택(陰宅) 이론에 따른 것일 것이다.
산 사람이 사는 집이 양택이요, 죽은 사람이 사는 집이 음택인데, 음택도 잘 가꾸고 다듬어 조상을 편하게 모셔야 한다는 게 풍수이론 이전의 우리의 심성이었다. 명절이 되면 묘소 역시 깔끔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게 벌초의 의미이다.
보통 벌초는 일 년에 한 번 하고 지나간다. 그러나 제대로 관리를 하려면 양력 4월, 장마 직후, 그리고 추석 보름 전, 세 번은 해야 언제 보아도 산소가 산소답다.
내가 어렸을 적 아버지는 벌초할 때 낫과 호미로 풀을 베고 잡초를 캐내 정성을 다 하였는데 나는 아버지의 정성스런 마음에 어림도 없다. 집안에서 한식을 지내지 않아 두 번 벌초를 하는데 동생이 풀을 깎으면 내가 갈퀴로 긁어낸다. 올 해는 아내를 동참시켰다. 땡볕아래 땀 흘리던 아내에게 미안하여 이번 추석에 아이들이 모이면 내년부터 혁신적인 벌초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흰소리를 쳤다. 벌초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젊은 자손들에게 일을 맡기고 불참하는 놈들에게는 일당을 받아 식사비로 쓰고 나머지는 교통비로 주겠다는 것인데 내 뜻이 먹힐지는 내년 벌초 때가 돼봐야 알 것이다.
5대조 이상 시제를 받으시는 조상의 산소는 종중에서 벌초를 해주어 벌초의 양이 많이 줄었다. 이전에는 8대조 이하 아버지 산소까지 아홉 분 산소의 벌초를 하자니 많은 시간이 걸렸었다. 십리길이나 떨어진 이곳저곳 산소를 찾아다니며 땀을 흘린다. 벌초에 동참해야할 노동력은 열 명 가까이 되지만 내, 외국에 흩어져 있고 참석을 못하여 관리에 힘들다는 이유로 몇 년 전 납골묘를 만들었다. 6대조부터 조부, 일찍 떠난 동생내외까지 납골묘에 안치하고 부모산소만 따로 두니 벌초를 두 곳만 하면 끝이다. 집안 다섯 집이 납골묘를 장만하였는데 산소를 없애 종중산이 많이 정화되었다고나 할까. 그러나 걱정이다. 내가 살아 있는 동안은 동생과 관리를 하겠지만 그 후는 어찌될까. 도시에 사는 아이들이 혹시 소홀하게 넘기지는 않을까, 납골묘를 만든 큰 이유지만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큰 아들에게 다짐을 받으려 하니 ‘아버지 보다 더 철저히 모실 테니 걱정 말라’고 큰 소리다.
선산이 있고 집안이 있는 우리네도 걱정인데, 도시에 살다 도시에서 세상을 뜨면 화장을 하고 공원묘지나 사찰 한 귀퉁이에 자리 잡을 고인의 사정이 안쓰럽다.
요새는 수목장을 택하는 이가 꽤 많다. 독일에서 시작되었다는데 독일에서도 그리 오래된 장법은 아니라고 한다. 어느 교수는 수목장은 기존의 매장제도와 화장제도에 비해 새롭고 간편한 대안으로 등장하였으나 넓은 공간을 차지하며 비용이 비싸서 다른 의미의 호화분묘가 될 수 있다는 걱정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어느 학자는 풍수적 관점에서 암석장(巖石葬)을 대안으로 이야기 한다. 고인돌에서 보듯이 우리민족은 고조선시절부터 암석장의 전통이 있다는 것이다. 자연석(박힌 돌)밑이나 돌 근처에 유골을 평장(平葬)하자는 것이다. 뒷동산이나 밭이나 돌 밑에다 장사지내자는 의견이다. 좋은 바위는 좋은 발복(發福)을 가져 온다면서...
내가 납골묘를 만들고 조상 산소를 파묘하여 다시 화장하고 항아리에 담아 납골묘에 모신 후, 가까운 친구에게 어쩐지 조상께 죄를 지은 것 같고 기분이 개운치 않다고 이야기 하였다. 이 친구, 수목장, 납골묘, 납골당 등 여러 곳을 살펴보고 묘안을 내었다. 산소가 있던 자리에 새로 산소를 만든 것이다. 파묘하여 화장을 한 것은 예와 같으나 200평쯤 되는 가족묘원 자리에 잔디를 심고, 윗대부터 차례로 한지에 분골을 싸서 항아리에 담지 않고, 땅을 두세 자 깊이로 파고 그대로 묻은 다음 적당한 크기의 네모 대리석을 덮었다. 개량된 평장이다. 옳거니, 내 왜 진작 이런 생각을 못하였는가. 조그마한 와비를 세우니 얼핏 보아 산소 같지 않고 돌을 덮었으니 산소임이 한 눈에 알 수 있고, 항아리에 담지 않았으니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흙으로 돌아갈 것인즉, 지금까지 보아 오고 경험한 장묘방법 중 으뜸이 아닌가. 묘지가 평평하고 풀을 깎기에 불편함이 없으니 힘도 덜 들것 같다.
암석장을 권유하는 교수는 풍수에도 좋고 벌초할 필요도 없다고 하는데, 글쎄, 바위 밑에다 조상을 감추듯 하는 게 올바른지. 벌초가 힘든 것은 틀림없는가 보다.